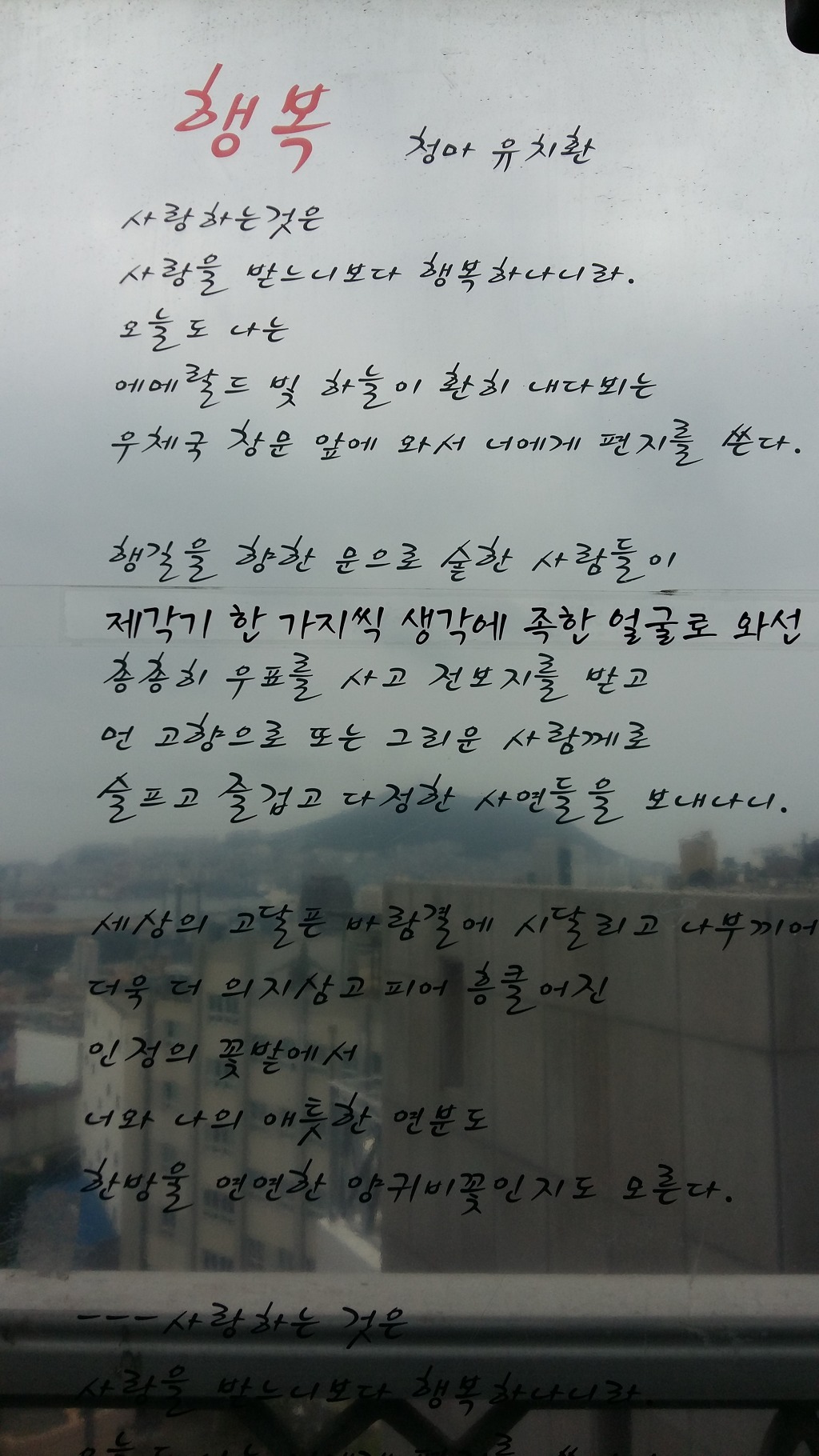자본/ 마르크스 지음/ 강신준 옮김/ 길 출판사
멘붕이다. 자본1-1,2를 어렵게 읽었다. 매일 조금씩 읽어서 4주만에 다 읽었다. 결말이 조금 미지근하다 생각했는데, 출판사를 검색하느라 알아보니 2권, 3-1권, 3-2권이 남아 있다. 잠깐 고민에 빠진다. 자본의 맛을 보긴 보았는데, 그럼 나머지 세 권을 어떻게 하지?
고민은 잠시 접어두고 읽은 것을 돌아보자.
1818년 독일에서 태어난 마르크스는 독일에서 공부를 마치고 대학에서 교수가 되고 싶었지만 반정부 활동으로 인해 교수로 임용되지 못하고 결국 프랑스로 추방된다. 독일 대학에서는 헤겔을 배웠다면 프랑스에서 마르크스는 사회주의와 엥겔스를 만난다. 나중에 프랑스에서도 추방된 마르크스는 경제학의 본거지 영국에서 <자본>을 위한 기초를 놓는다. 마르크스가 <자본>을 완결하지 못하고 죽자, 엥겔스는 마르크스가 남긴 자료를 가지고 나머지 <자본>을 완성한다.
마르크스의 저서 <자본>은 경제학을 다룬다. 영국에서 시작된 경제학은 '어떻게 하면 부를 창출할 수 있는가?' 쉽게 말하자면 '돈 버는 방법'에 관한 학문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마르크스의 경제학 저서 <자본>은 접근해 들어가는 방향이 다르다. 가치는 노동에서 산출된다는 고전경제학의 시각에서 보면 노동자는 부의 창출자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죽도록 일을 하는' 노동자는 '지독한 가난'에 허덕이는 이상한 현상이 발견된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이를 뒤엎으려는 혁명이 유럽을 휩쓸지만 이 모든 혁명이 실패로 돌아가고 만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르크스는 혁명의 실패 요인을 분석하면서 어떻게 노동자 혁명을 완수할 것인가 고민하게 되고 이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가운데 '죽도록 일하는 노동자들이 왜 그토록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는지 근본부터 파고 들면서 혁명의 당위성이나 방법론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물이 그의 저서 <자본>이다.
마르크스의 <자본>은 과학적 방법에 기대고 있다. 등가교환, 사용가치, 교환가치등의 개념에 근거하여 어떻게 잉여가치가 생성되는지 논리적으로 파고든다. 등가교환의 원리에 의하면 교환에 의해서는 잉여가치(이윤, 이익)가 생길 수 없다. 그것은 등가교환 즉 같은 가치를 가진 것들의 교환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자본으로 전환되는 잉여가치는 어디서 생기는가? 그것은 생산과정에서 생긴다. 자본자는 노동자에게서 노동력을 구입한다. 노동자는 돈을 받고 자신의 노동력을 판다. 자본자가 노동력을 구입할 때는 노동자가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만한 가치를 지불한다. 하루에 6시간을 일하여 자신과 가족의 생활비를 벌 수 있다면 그 6시간의 가치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불하고 노동력을 구매한다. 하지만 노동력을 구매한 후 자본가가 6시간을 노동만을 요구한다면 자본가에게는 남는 것이 없다. 자본가가 잉여가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6시간 이상을 노동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6시간을 초과한 만큼의 노동은 잉여가치가 되어 자본가에게 돌아가게 된다. 마르크스는 이것을 자본가들에 의한 노동자의 노동 착취라고 부른다. 결국 잉여가치는 착취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생산 양식이 발전하고 있던 당시의 상황은 그 착취가 어떠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을 예시를 들어가며 보여준다. 노동빈민들에 대한 연민, 탐욕적인 자본가들에 대한 분노가 생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연이어 서술된다. 정치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그런 가운데서도 노동제한 연령 및 노동 시간의 제한등 여러가지 조치가 취해지고, 공장법이라는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시도들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권력을 잡고 법을 만들고 재판을 하는 당사자들이 이미 자본가들인 이상 이런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리가 없다.
또한 <자본>에서는 자본주의가 시작된 역사적 경위도 파고 든다. 자본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자행되었던 대규모의 사기, 강탈, 폭력적인 상황등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본주의는 결국 내부의 모순으로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경고한다. 경고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자연 법칙처럼 어김없이 발생할 일이라고 예언을 한다. 민중에 대한 자본의 수탈이 자본주의의 성격이라면 민중에 의한 자본의 수탈은 자본주의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마르크스의 예언.
마르크스의 예언은 과학적 기초위에 놓인 예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마르크스의 예측은 지금 현재의 상황에 근거해 볼 때 실패한 것 같다. 자본주의의 붕괴보다는 오히려 노동자들의 혁명으로 세워진 공산주의의 붕괴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르크스의 예언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닌 듯하다. 자본의 붕괴가 미래에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기다려 봐야한다. 아마도 현재 진행중인 자본의 축적이 어느 한계에 이르면 어떤 형태로든지 자본의 붕괴가 일어날 것 같기는 하다. 그 방법은 알 수 없지만 자체적인 모순이 있는한 그 모순이 극에 달할 때는 뭔가 일이 벌어지게 마련이니까.
아직 고민이다. 자본 2, 3권을 읽어야 할까? 말까?
내가 이 책을 읽는다고 하자 한 지인은 이런 말을 하였다.
"이십대에 이 책을 읽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지만, 오십대에 이 책을 읽겠다고 하는 것도 문제다."
ㆍㆍ